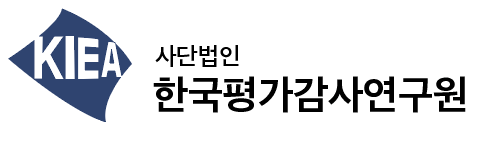최근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실시해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해당 사업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본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예타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정부사업에 대해서 적용되면서도 예외사항을 두어 면제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별 평가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시민들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경제성(35~4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의 평가항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2019년 5월 1일부터 비수도권사업의 경우 정책성 항목에는 변동사항이 없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에서 5%포인트를 낮춰서 30~35%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5% 높여서 30~40%로 변경한 반면, 수도권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성(50~70%)과 정책성(30~40%)으로만 평가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는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순으로 추진됨을 감안하여 정책평가와의 관계에서 예타 제도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타는 정책평가처럼 간주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평가”의 일환이기 보다 “정책분석”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타는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의 조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타는 당해 정부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예타 이후에도 착공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단계부터 보상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예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예타 후 최종 착공된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정책평가에 더 비중을 두고 사전평가, 과정평가, 결과(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예타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문제의 지속적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예비분석인 예타 만의 실시로 정부의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당해 사업과 그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정책평가를 상호보완적으로 실시해야만 예산낭비의 방지와 사업효과의 제고 그리고 사업시행의 책임성의 확보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예타가 특정 대규모 정부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착공 이후의 성패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로 추구하는 효과가 제대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감사로만 그치면서 예타에 치우치는 관행을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